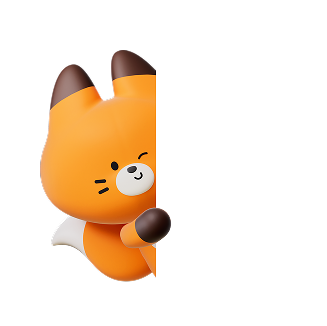👉 역량과 뇌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 역량의 본질과 측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인사 업무를 하며 역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역량이 무엇인지, 역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들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역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역량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역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뇌신경과학 측면에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앞선 콘텐츠에서(역량 결국 KSA 아닌가요) 역량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그 역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말할 때 주로 ‘뇌’를 예로 듭니다. 특히 뇌의 가장 앞쪽에 있는 ‘전전두피질’의 크기를 꼽지요. 사실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용어들이 워낙 낯설고 복잡하고, 뇌를 사용해 뇌를 생각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요.
우리가 강조하는 ‘역량’ 역시 전전두피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도 우선 뇌를 알아야 역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을 포함한 대뇌피질은 출생 이후 25세 전후까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서히 성장합니다. 영역별로 발달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사춘기를 지나 성년기에 접어들면 90% 수준까지 완성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전두피질의 성장과 함께 역량도 발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역량의 수준이 다른 것은 역량이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뇌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전두피질은 기능에 따라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가치를 판단하고 학습하는 ‘가치령’,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전략령’, 가치와 전략을 통합하는 ‘통합령’이 그것이지요. 이 세 영역에서 긍정성, 적극성, 안정성, 대인력, 전략력, 조절력, 통합력까지 일곱 가지 ‘기반역량’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기반역량은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고 성과를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역량의 본질은 '기억'
역량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으면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기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면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던 행동을 선택하고, 나쁜 결과를 얻었던 행동은 회피합니다. 긍정 기억은 선호하는 행동을, 부정 기억은 회피하는 행동을 만드는 것이지요. 사람은 기억에 채색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이성은 감정이 판단한 것을 인식해서 그럴듯한 사후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좋았던 ‘쾌(快)’와 나빴던 ‘통(痛)’을 통해 가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몇 차례 보고를 해본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리더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학습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뇌는 ‘자극-예측-반응’ 회로를 매순간 가동하며 기억을 형성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경망이 구축되고, 그 신경망이 강화되어 만들어진 ‘신경경향성’이 바로 고유의 역량이 됩니다. 결국 역량의 본질은 ‘기억’인 셈이지요.

📌역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신경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역량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반복 강화된 뇌의 ‘신경경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이 형성되고 나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패턴을 따라 작동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웃으며 인사하고,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과 첫 만남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역량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역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역량을 측정하려면 우리는 역량을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앎’이란 현상-경향-속성-이치-원리의 단계를 거치며 이를 수 있고 그 바탕에는 인과체계가 있으며, 그 인과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한때 우리는 뇌를 일종의 블랙박스로 여겼고, 실제 뇌의 기능도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착실하게 쌓아온 과학적 연구가 점차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은 인간 본질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었지요. 현상 중심의 인식이 아닌 본질 기반의 역량 개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과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뇌의 성과 메커니즘에서 도출한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입니다. 성과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곱 가지 기반역량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지요. 이런 성과역량은 뇌의 비인지적 영역에서 발원하고 또 경향성을 띠다 보니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같은 선발도구로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역량은 뇌의 신경망에 의한 것입니다. 뇌의 신경망이 만들어내는 힘(성능)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인 것이지요. 따라서 뇌와 신경망을 관찰하고 분석하면 역량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수준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요. 생물학과 신경과학에 기반한 검사 방법과 기술을 채용에 도입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가장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육성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람마다 역량의 수준이 다른 것은 역량이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뇌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자극-예측-반응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구축된 신경망이 강화되어 형성된 신경경향성이 '역량'이되는 것입니다.
- 성과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뇌의 성과 메커니즘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png)